등록 : 2012.06.20 19:33
수정 : 2012.06.20 2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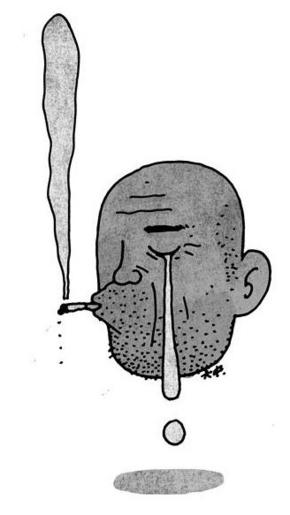 |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
5년째다. 담배를 붙잡고 씨름한 지. 처음 금연상담을 시작한 계기는 공포영화식 금연교육에 두드러기가 생겨서다. ‘왜’ 피우는지에 대한 이해의 결핍은 마주치는 금연사업마다 넘쳐났다. 그래서 스스로 해답을 구하고자 의학이 아닌 인류학의 도움까지 요청하게 됐다. 그러면서 조금씩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놀랍게도 늘 만날 수 있는 일상의 흡연자에게 귀 기울인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었다. 담배의 전문가가 바로 그들임에도.
역사는 이야기한다. 누가 진정 담배에 중독되었는지를. 17세기 말 전 유럽에서 담배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가 바로 담배가 지닌 ‘세입수단’으로서의 가치의 ‘발견’이었으며,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자마자 우선적으로 착수한 일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한 일이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갑에 붙은 세금이 1549원이라는 사실은 과거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말해준다. 그렇기에 흡연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세간의 비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백번 옳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더 큰 아픔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흡연자를 ‘차별’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인 남성 전체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계층별 흡연율 격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소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금연할 여유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이야기다. 이것의 결말은 무엇일까? 최악의 경우 흡연은 못 배우고 못사는 사람들의 ‘교양’ 없는 행위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배우, 대통령, 감독, 시인, 작가.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사람들은 이들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이들의 ‘낭만’적인 담배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담배는 거리가 멀다. 적어도 내가 접해온 흡연자들에게 흡연은 낭만보다 ‘생계’에 가까웠다. 이들에게 담배 한대의 낭만을 얘기한다는 것은 진정 사치다.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는 “담배만한 게 없다”고 강조하는 이들에게 담배는 훌륭한 생계의 ‘도구’였다. 생계의 현장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인간의 몸은 솔직하다. 지금껏 만나 인터뷰한 어떤 노동자도 담배를 미화시키지 않았다. 그보다는 흡연이 잠을 쫓아주고, 일에 집중하게 해주고, 화를 식혀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가래가 끊이지 않고, 숨이 자주 가쁘고, 목이 따갑다고 하소연했다. 끊을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는 사람은 있어도 금연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몸이 주는 신호를 몰라서 끊지 않으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지만 흡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생계형 흡연자만이 점점 더 죄인으로 남아 있게 되는 현실. 이게 흡연 앞에 우리가 처한 진짜 현실이다.
서울시가 건강형평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금연교육과 상담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미력한 능력을 보태고 있다. 금연의 경우만 보더라도 생계형 흡연자는 세계 어디든 항상 금연의 외곽지역에 있었다. 이들에게 죄인의 덫을 씌우고, 의무로서의 금연을 강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삶의 짐을 덜어줄까 고민할 뿐이다. 돌이켜 보면 담배만큼 그 누가 서민들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을까 싶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차피 담배도 사람이 만든 것이지 않는가.
김관욱 가정의학과 의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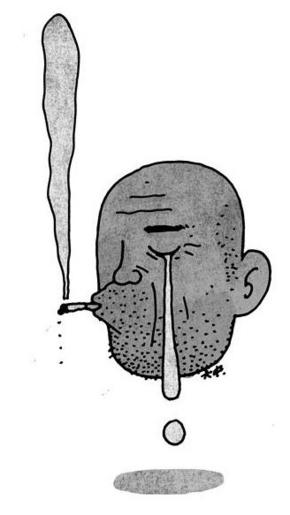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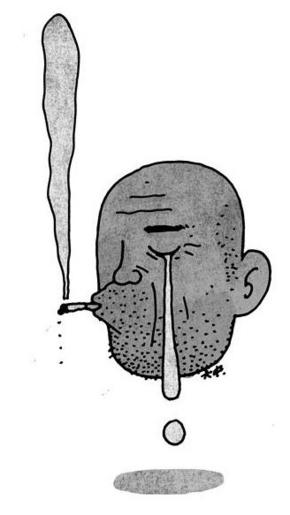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