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9 07:41
수정 : 2019.08.15 16:04
[한겨레-CJ문화재단 공동기획]
45)밀양
감독 이창동(2007년)
 |
|
아들이 유괴당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신애(전도연)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동네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종찬(송강호)은 연모하는 신애에게 짙은 연민을 느낀다.
|
한 젊은 여성 신애(전도연)가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온다. “남편의 살아생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퇴행적 결단에 가깝다. 사업수완이 좋지 못했을뿐더러 외도까지 했던 남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녀의 꿈을 깨뜨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신애는 자신의 환상과 참담한 현실 사이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낯선 공간에 들어가 자신의 불행을 은근히 흘리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당차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돈 있는 척 허세를 부렸던 그녀에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또 한번의 시련이 찾아온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났는지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그저 ‘신의 섭리’라는 말뿐이기에, 신애는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 그러나 결국 자신보다 먼저 살인범을 용서한 신을 그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밀양>은 인간이 신에 저항하며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퉈보려 한다는 점이나, 고통의 근원 및 구원의 방법론에 대해 이전까지의 어떤 한국영화들보다 성의 있게 답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품이다. 또한 이창동 감독이 원작인 <벌레 이야기>(이청준)에서 직관적으로 느낀 것처럼 <밀양>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메타포로도 읽힌다. 피해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가해자가 먼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상황의 역설이 영화에도 잘 배어들어 있다. 1997년에 감독으로 데뷔한 이창동은 역사에 대한 부채감과 사회저항의식을 주제로 삼고, 장르를 외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코리안 뉴웨이브와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의 어느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창동의 두번째 장편 <박하사탕>(1999)이 개인의 삶을 쥐고 흔들었던 폭정의 날카로운 펜화였다면 <밀양>은 성찰을 바탕에 깔고 장르와 은유라는 색깔로 덧칠한 유화다.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전도연뿐 아니라 영화 전반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송강호의 연기도 볼수록 놀랍다.
윤성은/영화평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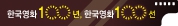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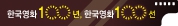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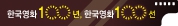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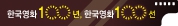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