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9.02 21:04
수정 : 2009.09.02 2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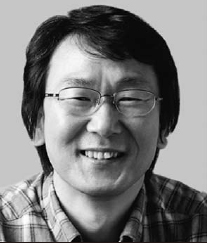 |
|
우종원 일본 사이타마대 교수·경제학
|
민주당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탄생한 데 이어 일본에서도 민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앞서 2007년 11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수연합정권을 누르고 노동당이 11년 만에 정권을 장악했다.
지난 10년을 주도한 부시(미국 공화당), 고이즈미(일본 자민당), 하워드(오스트레일리아 자유당)는 뚜렷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규제 완화, 이라크 전쟁, 시장원리주의가 그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친했던 이들 세 정권이 차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이들이 대표했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만 시대의 흐름에서 튕겨나온 채 외톨이가 되었다. 성장을 하려면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여전히 활개친다. 시장원리주의 역시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나선 점이다. 그 진의를 떠나 시대의 흐름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는 정치적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정작 문제는 다음 정권을 ‘담당해야 할’ 민주당이 역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가면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 주장한다. ‘부자 대 서민’으로 대결구도를 가져가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예를 들어 일본 자민당의 참패를 “권위, 극우보수, 부자 정권의 몰락”이라 규정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낡은 시대 인식이다. 자민당은 단순한 부자 정당이 아니다. 성장을 통해 ‘1억 총중류’를 실현한 정권이다. 자민당의 한계는, 공공사업 등을 통해 이익집단에 돈을 뿌리고 이것이 서민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른바 이익유도 정치가 1990년대 이후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고이즈미였다. 고이즈미는 이익유도 정치의 타파를 내걸었고 이는 한때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고이즈미가 기댄 것은 시장원리주의였다. 그리고 이는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에의 과도한 의존, 기업의 책임 경감과 비정규직의 양산, 사회보장의 약화와 지역간 및 계층간 격차 증대를 초래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이런 시장원리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자 대 서민’의 단순 논리를 뛰어넘어, ‘지방분권과 생활’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데 있다. 시장 자체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지나친 시장화는 리스크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다수 만들어낸다. 그 결과, 이들이 사회 번영을 위협할 지경이 되면 시장은 다시 통제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이 고용의 시장화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따라서 핵심은 ‘부자 대 서민’이 아니다. ‘성장 대 분배’도 아니다. 시대의 화두는 ‘시장 대 제도’이며, 어떻게 하면 사회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개인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내세우는 ‘중도와 서민’ 속에 시장의 적절한 규제와 효율성의 통합이라는 비전이 녹아들어 있는가. 없다면 “성장의 과실을 적당히 나누어주는 것”으로 버티다가 몰락한 일본 자민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세계화의 리스크를 억제하고 그 이익을 서민에게 골고루 나누기 위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효율을 양립시키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고용관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가. 이에 관한 시대적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당은 결코 ‘민주당의 시대’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종원 일본 사이타마대 교수·경제학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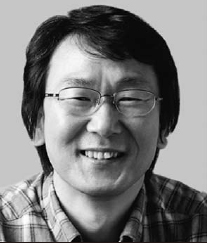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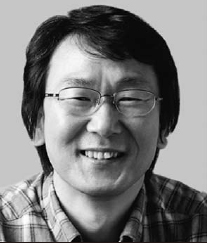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