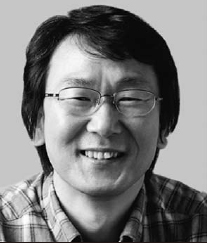 |
|
우종원/일본 국립 사이타마대 경제학부 교수
|
삶과경제
이맘때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며 이웃과 마음을 나누기 마련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많지 않은 이곳 일본에서도 성탄절은 따스하다. 하지만 올해는 일자리를 잃고 공동 숙사를 쫓겨나는 사람들 때문에 캐럴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찾는 것이 중요한 법. 원로 몇 분과 함께한 송년회 석상에서 일본 사회의 전망을 물어보았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일본 모델이 다시 한 번 꽃필 수 있을지가 포인트였다. “글쎄, 어렵지 않을까.” “왜요?” “우리가 일선에 있을 땐 직원을 자르기 전에 경영자가 먼저 희생한다는 각오로 임했어. 그런데 요즘 뉴스 좀 봐요. 인원 정리를 발표하는 경영자들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스럽지 않나 말이야.” 실제 종업원을 중시한다는 일본 모델은 빛이 바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도요타·캐논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대거 정리한 충격이 컸다. 소니는 한술 더 떠 정규직까지 정리하겠다고 나섰다. 모기업이 이럴진대 관련 기업이나 부품 기업은 말할 나위도 없다. 고용 보장을 중심으로 통합력을 유지해 오던 일본 사회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일본이 약진한 계기가 된 것은 30년 전의 석유위기였다. 미국과 유럽이 침체의 늪에 빠지는 가운데 일본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란 획기적 방식으로 제조업을 제패했다. 그 토대가 된 것이 일본 모델이었다. 경영자는 종업원을 위하고 종업원은 ‘개선’(改善·가이젠)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대공황이 닥쳤을 때 민주당 정부가 뉴딜로 이를 극복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렇지만 뉴딜의 핵심은 결코 댐공사나 공공사업이 아니었다. 전국산업부흥법(NIRA)의 주안점은 오히려 노동조합을 장려하는 데 있었다.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써 내수를 확대하려 한 것이다. 미국은 이런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바탕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미국 모델을 정립해 이후 30년이나 세계경제를 이끌었다. 자동차산업에서 보듯 경직된 생산방식과 노사관계에 비롯된 생산성 정체로 일본에 주도권을 넘겨주기까지. 우리 역시 못할 게 없지 않은가. 2008년의 이 위기를 한국 모델 창조의 전기로 삼는 것은. 토대는 충분하다.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수준도 낮은 편이 아니다. 정치만 빼면 사회적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우선 극복해야 할 장애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비정규직이다.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마당에 비정규직이 절반인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애써 교육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는커녕 인적자원을 마냥 소모해야 할 판이다. 또 하나는 무능한 정치다. 고부가가치와 신산업에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여당 대표가 온 국토를 공사장처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모델을 꿈꾸는 것은 우리도 일본을 한번 따라잡아 보자는 민족주의를 고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델이란 지속 가능한 선진사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토목공사가 이를 가져다주리라 믿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정부에 희망은 없다. 하지만 아직은 미련을 버리고 싶지 않다. 새해가 한국 모델의 출발점이 되는 꿈을 포기하고 싶기 않기에.우종원/일본 국립 사이타마대 경제학부 교수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