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2.04 19:43
수정 : 2008.02.04 1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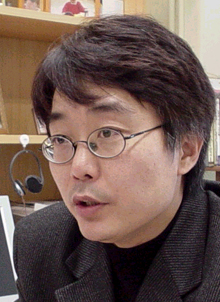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
|
윤태진/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
야!한국사회
작년 3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영어수업을 받았다. 원어민 교사가 들어와서 영어로만 “솰라솰라” 했단다. 에이비시(ABC)도 모르는 우리 아이는 멍하니 40분을 보냈다. 이어서 영어로 일기를 쓰는 숙제를 받아왔다. 흥분한 애 엄마가 짧은 영어로 항의문을 써 보냈다. 답변은 간단했다. 자기는 부여된 역할을 할 뿐이고, 수업 진행도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단다. 그럴 만했다. 외국에서 살다온 학생도 몇 있었고, 1년 이상 영어학원을 다닌 아이들이 반을 넘었다. 우리 집 아이가 영어를 미리 배우지 않은 것은 뭐 대단한 교육철학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한글도 모르는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는 싫었다. 학교에서 겨우 집 찾아오는 1학년 꼬맹이를 학원에 보내기도 싫었다. 영어 배울 기회는 많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잘 가르쳐줄 것이라 믿었다. 내가 틀렸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있으면 편리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쟁취해야 하는 투쟁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끊임없이 내게 이야기한다. “너 틀렸다”고.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영어교육 계획은 언뜻 봐도 참 엉성하고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고집스럽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판을 했지만, 인수위 사람들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굿모닝”을 외친다. 여론은 단지 ‘순수한 영혼을 가진’ 대통령 당선인의 심오한 실용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중의 목소리로 간주될 뿐이다. 끊임없이 국민을 계몽하려 했던 참여정부의 독선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화려하지만 더 두꺼워진 오만의 탈을 쓴 셈이다. 참여정부의 계몽주의가 정의나 개혁이라는 명분을 자양분으로 삼았다면, 새 정부의 계몽주의는 경제가 근간이다. 또 경제다. 영어교육을 통한 경제성장!
영어가 경제라는 말은 맞다. 계층이 나뉘고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영어는 심각한 경제적 쟁점이 된다. 영어수업 시간이 늘어날 때, 학부모들은 “영어가 (입시에 있어서) 더 중요해졌다”라는 메시지만을 접수한다. 그리고 (그동안 그래왔듯) 기를 쓰고 선행학습을 시킬 것이다. 학원 보낼 여유가 없는 부모는 에이비시 교본이라도 사 줄 것이다.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니” 1년쯤 외국연수 보내는 부모들은 더 늘어날 테고, 방학 한 달 영어캠프에라도 보내고 싶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 부모들은 자책감으로 가슴을 칠 것이다.
4조원이라는 돈과 토건시대식 추진력을 투여하면 5년 후의 우리는 과연 더 행복해져 있을까? 영어교육 덕분에 소득이 좀 늘더라도 혹시 그 강렬한 집단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지는 않을까? 국민들 영어교육 시키다가 건강보험 적자가 늘어나는 건 아닐까?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차기 정부가 5년을 내다보며 고민해야 할 분야는 영어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다. 국민들이 모두 불편 없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건강할 수 있다면, 그 쪽이 더 나을 것 같다. 모두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모두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다면 더더욱 좋겠다. 모두 행복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첫 영어수업을 마친 후, 결국 무서운 현실에 백기를 들고 아이를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영어학원에 보냈다. 수준에 맞는 반이 없단다. 결국 1학년 동생들과 한 반이 됐다. 1년이 지났지만,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은 여전히 ‘휴식’ 시간이다. 손만 들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조용히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 원어민 선생님의 말은 점점 빨라진단다.
윤태진/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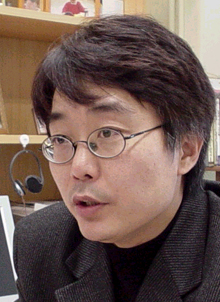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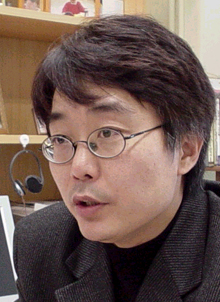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