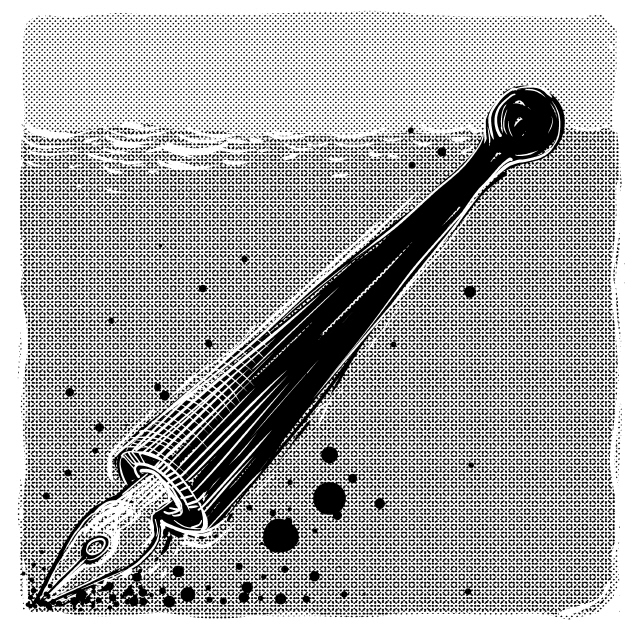 |
|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
옳고 그름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가치 판단이 종이신문 존재 의의
치열하게 현장 뛰되 사실보도 넘어 진실을 보여주는 ‘한겨레’ 되길
신문은 한때 여론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이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요리하는’ 데도, 박정희가 무자비한 폭압과 독재를 펴는 데도 신문은 요긴한 ‘도우미’였다. 한 일간지 대표는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위세를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법. 신문이 ‘생존’을 위협받는 세상이다. 독자들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졸아든다. 그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너도나도 신문을 구독하던 시대의 풍경은 전설로만 남아 있다. 그 근본 원인이 ‘디지털’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디지털 태풍’ 앞 신문의 신세는 ‘가물거리는 촛불’이다. 맞다. 종이신문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매체다. 특히 디지털 문화에 젖은 젊은이들에겐 어딘지 낯설다.
그렇다고 종이신문의 매력까지 사라진 것일까. 그 가치, 존재 의의도 무의미해진 걸까. 아니다. 아날로그 문명의 ‘통찰력’이야말로 디지털 문명의 ‘에너지’이자 ‘엔진’이다. 또한 정보 홍수 시대는 ‘정제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신문은 살아남을 이유가 충분하다. 디지털 시대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고 믿는다. 언론을 말할 때 떠오르는 두 마디, ‘가치’와 ‘신뢰’가 그것이다. 언론은 민심이 추구하는 가치체계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언론은 또한 양심적인 보도로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 신문의 진정한 위기는 가치체계의 혼돈과 신뢰의 파탄에 있다. 신문의 핵심 덕목을 해치는 몇 가지 현상을 살펴본다.
‘정보’, ‘콘텐츠’는 디지털 시대 신문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도전적인 실험도 더러 눈에 띈다. 문제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곧 ‘정보지’에 집착함으로써 신문의 본령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은 단순한 정보지가 아니다.
세상은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영악한 인간은 빼어난 말솜씨로 진실을 호도한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분간하기 어렵다.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권력은 옆길로 새기를 좋아한다. 권력의 단맛을 좇다 보면 일탈하기 십상이다. 기업가와 노동자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논다. 세상을 보는 그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세상의 진실을 설명할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신문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권력의 탈선을 견제할 책무를 신문에 부여한 것은 사회적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신문들은 권력 앞에 무력하다.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신문의 사명은 잊힌 지 오래다. 단순한 정보지가 아닌 ‘정론을 담은 공기(公器)’가 신문인 것을. 정론은 언론 정신이자, 시대의 ‘혼’이다. 정론이 사라진 시대는 영혼 없는 시대를 의미한다. 정론을 포기한 신문은 ‘찌라시’에 지나지 않을 터. 찌라시 시대의 혁파가 절박하다.
신문을 이념지도에 꿰맞추는 버릇도 한국 언론의 병폐다.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신문은 참언론이 아니다. 적어도 주요 일간지 가운데 스스로 정파지임을 안팎에 분명히 밝힌 신문은 없다. 사실을 보도하는 데 이념적 성향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 비판적 기사 역시 보도 원칙에 따라 작성할 일이다. 사회적 상식과 윤리·도덕, 가치체계 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이념성’을 편향적 보도의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념적 딱지’를 붙인 집단에 대한 ‘맹렬한 비판 기사’에서, 또는 권력의 탈선에 대한 축소 보도나 ‘침묵’에서 두드러진다. 이런 현상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이념성의 과장, 정상적인 언론에 대한 ‘이념적 오해’, 사회적 분열의 가속화 등을 초래하곤 한다. 편향적 보도 태도에 이념성을 부여하는 것은 난센스다. 차라리 ‘제대로 보도하는 신문’과 ‘제멋대로 보도하는 신문’으로 나누는 게 유용한 구분법이 될 수 있다.
이념적 분류법은 ‘생물학적 다양성’을 원천봉쇄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사람마다 그 성향은 제각각이다. 사람 수만큼 다양한 색깔을 보이게 마련이다. <한겨레>도 <조선일보>도 그 점에선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유일 체제’가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울 따름이다. 예컨대 40년 전 그 뜨거운 저항의 물결 넘실대던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평온’은 불가사의다.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의 ‘역동성’이나 ‘활력’도 시민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현장’은 언론인에게 부여된 최고의 특혜다. 말이나 학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전국 순례길에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은 아무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문들은 자유무역협정(FTA) 때마다 농업 부문의 피해를 강조하지만, 그 실상을 파고드는 농촌 르포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부처나 기업의 보도자료 베끼기로는 디지털 시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최근 ‘천재 소녀’의 미국 명문대 입학 허가 기사는 오보로 드러났다. 온 나라의 신문 방송이 거짓 제보에 놀아났다. 이는 예고된 ‘참사’였다.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 오늘>은 최근, 오늘도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미디어 오늘>은 ‘침몰한 언론, 진실을 인양하라’고 질타했다.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언론은 이미 죽은 언론이다. 비판 기능의 마비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거짓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도 하다. 독자들은 다각적인 정보망을 통해 감지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창조성의 회복은 놓칠 수 없는 언론의 과제다. 현대 사회 갈등의 해소와 통합,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도 언론의 몫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사실’을 뛰어넘는 통찰력의 예술이다. 창조성은 사회적 활력과 역동성을 일깨울 힘의 원천이라고 믿는다. 언론의 창조성은 자신을 비우는 겸손에서 창출될 수 있다. 스스로 비울 때 마음의 눈도 떠지는 법.
 |
|
고영재 언론인·전 경향신문사 사장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