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 <한겨레> 자료사진
|
 |
|
한미연구소 구재회 소장. <한겨레> 자료사진
|
 |
|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겨레 사설] ‘방만 운영’ 논란 끝에 문 닫은 한미연구소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소장 교체 외압 논란 끝에 오는 5월 폐쇄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문을 닫게 됐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감독 없이 장기간 지속된 ‘불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설립된 한미연구소는 지난 11년 동안 2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한두 장짜리 결산보고서만 냈고,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여야가 합의해 올해 3월까지 불투명한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 지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구소의 최종 관리·감독을 맡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구재회 소장 교체를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미연구소가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오는 6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구소 쪽은 청와대가 보수진영과 가까운 구 소장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언론도 이를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앞뒤 사정을 보면 설득력이 높지 않다.
오히려 한미연구소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연구 실적 저조가 문제라는 지난해 국회의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한미연구소는 설립 이래 구 소장 등의 인건비에 예산 절반을 쓰고 한국학 전문가 양성 등 핵심 사업에는 예산의 4분의 1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2016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애초 사업계획에 없던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와 공동세미나’에 8만달러를 집행하고도 사후 보고가 없었다. 설립 이래 11년째 소장직을 맡고 있는 구 소장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받아 사실상 마음대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선 정부의 연구소 소장·부소장 퇴진 압력이 너무 무리했다는 주장을 편다. 이 부분은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만 운영 문제를 놔두고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됐으니 정부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반도 전문가 양성이라는 애초 취지에 맞게 예산 지원 계획을 다시 짜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
청와대의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국 한미연구소(USKI)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다음달 문을 닫게 됐다. 연구소가 속한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에게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끊어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반도 연구를 통해 미 정·관계와 학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해 온 워싱턴의 소중한 싱크탱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 이번 사태에서 USKI도 전혀 허물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연구소 측은 감독기관 격인 SAIS와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깐깐한 회계 감사를 받으니 별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온 한국 측에 간략한 결산보고서만 내고 나 몰라라 했다면 이를 정상적인 처리였다고 하긴 힘들다. 게다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마다 지적됐던 사안이라고 하니 어떻게든 고쳐야 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구재회 소장과 함께 이번 일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38노스’ 담당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바꾸라고 했다면 이는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 너무 거칠게 밀어붙여 정권 코드에 따라 외국 연구기관을 손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대학은 물론 싱크탱크도 객관적 진실을 좇는 학문의 전당이다. 이런 곳은 아무리 지원하더라고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게 옳다. 그래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사실이 왜곡되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
특히 USKI가 폐쇄되면 10여 년간 200억원 이상 쏟아부어 정성껏 가꿔 온 공공외교의 결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돼 더욱 가슴 쓰리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 정·관계 및 학계에 대한 영향력 부족이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과 관련해 큰일이 터졌을 때 막상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마땅한 채널이 미 정·관계에 적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80년대 이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며 꾸준히 공공외교를 펴 왔다. 워싱턴에 ‘국화파’로 불리는 친일세력이 단단히 뿌리내리는 데엔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운 공공외교의 공이 컸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4800억원 가까이 공공외교에 쏟아붓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500억여원)은 9분의 1에 불과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된 게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세워진 USKI다. 이 연구소를 통해 남북한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국 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이제 12년이 된 USKI가 제 몫을 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 내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을 이토록 거칠게 다뤄 허망하게 없애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에다 통상마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제라도 이 소중한 기관이 문 닫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뿔을 고치겠다며 소를 잡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엔 시국이 너무나 엄혹하다.
[추천 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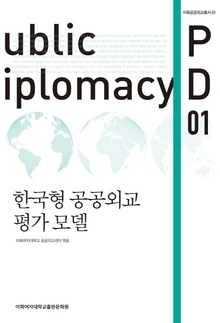 |
[키워드로 보는 사설] 한미연구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SAIS)의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인 한미연구소(USKI)는 6·25 참전용사이자 <워싱턴 포스트>(WP) 국제문제 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남북관계를 다룬 <두 개의 한국> 저자인 돈 오버도퍼 교수가 2006년 세운 연구소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핵 특사 출신으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소장은 구재회, 부소장은 제니 타운이다. 존스홉킨스대 소속 민간연구소지만 예산은 전액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왔다. 연구소의 성향을 보수·진보로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38노스(north)’의 학술적 성향은 미국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2006년부터 약 200억원의 정부지원금, 즉 연간 20억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 2013년부터 운영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적이 있어 왔으며, 상세한 결산보고 요구에 대해 한미연구소는 2쪽짜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실 보고 논란을 일으켰다. 한미연구소의 운영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예산 투명성 부족과 운영 방향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매년 20억원씩 제공해 오던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쪽은 한국 정부가 구재회 소장의 경질을 여러 번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예산을 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쪽 인사가 나서서 구 소장의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연구소 운영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연구소 쪽의 주장이다. 반면 정상적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