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이스촌 지방관 파면운동이 ‘한알의 불씨’
무력진압됐지만 부패·개발지상주의에 경종
홍콩 민주화 영향… 검열 통한 통제 불가능
7.중국 광둥성
지난 1일 중국 남동부 광둥성 광저우시 판위구의 어우캉서우 당 부서기가 타이스촌이라는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이 마을은 지난 9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다. 민정국, 공안분국 간부 등이 동행했다.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던 이들은 이날 막 완성된 두 가지의 ‘민심 공정’을 시찰했다. 하나는 마을 안 15㎞의 거리에 가로등 330개를 설치한 ‘광명 공정’이고, 다른 하나는 1㎞ 남짓한 마을길을 시멘트 포장도로로 바꾸는 공사였다.
이 마을에 ‘새마을운동’식 풍경이 벌어진 건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이어진 주민들의 시위사태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마을 주민들은 부패 무능한 촌위원회 주임 천진성을 파면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주민들은 촌정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지방정부는 무장경찰을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했다. 이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던 인권 변호사 궈페이슝(39·본명 양마오둥)은 ‘군중 선동과 사회질서 교란’ 혐의로 구속됐고, 뤼방례 후베이성 인민대표는 경찰에 집단 구타당해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
|
지난 6일 무장경찰의 발포로 가족을 잃은 광둥성 산웨이시 둥저우촌의 한 유가족이 길거리에 빈소를 차린 뒤 향을 피우고 있다. <아주주간> 인터넷판
|
 |
|
지난 9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판위구 타이스촌 주민들이 부패한 지방관리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이들을 막고 있다. <아주주간> 인터넷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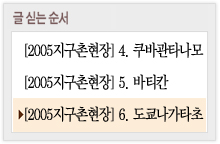 |
|
[2005지구촌현장] 7. 중국 광둥성
|
광둥 타이스촌과 산웨이의 유혈사태는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부정부패와 개발 한탕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2003년 5만8000건이던 ‘집체사건(집단 항의 사건)’이 지난해엔 7만400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월말 이미 8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된다. 개발업자와 지방 부패관리가 짓밟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민초들의 뜨거운 함성은 메아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기사공유하기